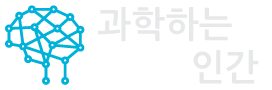엠페도클레스가 처음으로 주장한 4원소설 “만물의 근원은 흙, 불, 물, 공기다.” 는, 플라톤을 거쳐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384 ~ 322 BC)가 보완하며 연금술이 나오게 했다. 물질의 기본단위(원자)가 있다고 생각한 데모크리토스 외에 그리스의 여러 현인들은 자기 나름의 추론을 통하여 만물의 근원에 대하여 한 마디씩 했다. 그러나 자기의 주장을 실제로 관찰과 실험으로 검증할 수 없었고 검증에 진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주장들을 과학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하나의 사변적 가설 정도로 봐야 할 것 같다.
뒤에 뉴턴이 완성한 과학혁명을 통하여, “객관적 관찰과 체계적 이론의 부합”이라는 과학의 방법론이 정립되었지만, 고대 그리스에서도 어느 정도의 과학적 태도는 있었다. 그 시대의 관찰 역량은 그 시대의 기술 수준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관념의 이성은 우주와 자연의 본질로 왕성하게 질주했다. 관찰의 현실적 한계를 넘을 수는 없었지만, 논리의 체계성과 주장의 정당성을 갖추려고 했다. 폴리스마다 있었던 아고라 광장에서는 시민들이 자기의 견해를 주장하며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하여 노력했다.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되는,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연역적 방법론은 현대에서도 논리체계의 핵심이 된다. 고대 그리스의 연역적 논증법은 유클리드의 ‘원론’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며, 2천년 후 뉴턴의 ‘프린키피아’에서도 뼈대가 된다. 사회적으로도 유클리드의 원론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은 판 수를 기록할 정도로 인간의 이성과 문화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 ZFC 공리계(Zermelo–Fraenkel set theory with the axiom of choice)[1] 위에 지어진 가장 엄밀한 학문분야인 현대수학도 연역적 논증체계이다.
연역적 논증은, 누구나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명제 몇 개를 전제로 두고, 이 전제들로부터 여러 명제들을 발견하고 증명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때로 어떤 명제는 이 전제들로부터 부정될 수도 있다. 우리가 자연원리를 찾아서 다양한 자연현상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방법도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자연 어디서나 성립하는 보편적 전제(자연 원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그로부터 자연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명제들을 발견하거나 부정함으로써 우리의 지식과 관점을 보다 명쾌하게 정리하며 다음 단계로 진일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과학은 연역적 논증에서 멈추지 않는다. 수학과 다른 점은 우리가 찾은 명제들을 과연 자연이 선택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과학을 자연을 설명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이론이라고 한다면, 이론을 어떻게 합리화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찰을 얼마나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중요하고 이론과 관찰은 물론 서로 어울려야 할 것이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IV. 과학의 이해’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1] http://bitly.kr/4EF5 및 http://bitly.kr/QNeb 참고